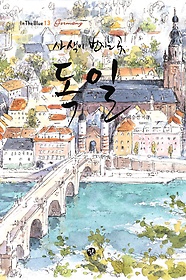 | 사색이 번지는 곳 독일 백승선 | 쉼 | 20130615 평점      상세내용보기 | 리뷰 더 보기 | 관련 테마보기 |
독일하면 저마다 연상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맥주, 축구, 소시지, 베를린 장벽, 히틀러, 전쟁 등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개인적으로는 직업 탓에 ‘독일’ 했을 때 바흐, 베토벤, 바그너, 브람스, 슈트라우스 등 클래식 음악가들도 함께 떠올랐고, 그래서 열세 번째 번짐 시리즈로 독일을 만난다고 했을 땐 이 음악가들에 대한 흔적을 사진으로 또는 작가의 감성 가득한 글로 만날 수 있길 내심 기대했었다. 하지만 제목에서부터 <사색이 번지는 곳 독일>인지라 나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어쩌면 내가 독일에 대해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끔 해 주었다.
알다시피 독일은 유럽 7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래서 지금껏 독일 여행하면 유럽 순방 중 지나는 길에 잠시 둘러보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그래서 다들 독일 최대의 공항이 위치한 프랑크푸르트나 수도인 베를린에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사색이 번지는 곳 독일>에서도 수도 베를린에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긴 한데 시작은 동물음악대로 유명한 도시 브레멘부터 출발한다. 동화로 잘 알려져 있는 브레멘 음악대의 내용이 가물거리던 참에 저자는 간략한 줄거리 소개도 잊지 않고 있다. 저자의 설명을 들으니 엊그제 본 듯 브레멘 음악대의 동물들이 떠오르며 도시에 상징처럼 자리한 동상들이 정겹게 느껴진다. 그리고 도시를 지키는 롤랜드 상의 손때 묻어 검게 변한 무릎도 인상적이었다.
이어 베를린은 동명의 영화를 봐서 그런지 도시의 풍광에서 영화 속 장면들을 나도 모르게 찾고 있었다. 영화에서는 잿빛 풍경이 암울해 보였지만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던 장벽이 무너지고 난 뒤 이 도시는 그 자체로 통일 독일과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영화의 무대 역시 세계 유수의 도시 중에서도 베를린이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니 음악당의 독특한 객석 구조도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끔 영상으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볼 때면 오케스트라를 둘러싼 관객들의 모습이 이색적이었는데 객석이 무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파격적인 구조 때문이다. 여기서 베를린 필의 실황을 감상하는 건 과연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도 베를린의 또 하나 의미있는 곳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파크였다. 이것을 보며 일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독일은 나치 시대에 저지른 유대인에 대한 만행을 부정하거나 숨기는 대신 그들에게 사죄하고 그 잘못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 공원에서도 엿보인다.
엘베 강의 멋진 노을을 볼 수 있는 독일의 피렌체, 드레스덴. 하지만 나에겐 ‘드레스덴 뮤직 페스티벌’의 도시로 더욱 친숙하다. 5월에서 6월에 걸쳐 3주 정도 개최되는 이 음악제에는 세계 내놓으라는 오케스트라들이 참여해 그야말로 음악의 도시 독일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하지만 책에서는 젬퍼 오페라 극장을 소개하며 독일의 유명 음악가들은 잠깐 언급만하고 지나가서 아쉬웠다. 게다가 작곡가 슈트라우스와 바그너는 일반적으로 독어식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리하르트 바그너’로 표기하는데 책에서는 이름만 영어식인 ‘리차드’로 표기해 놓아 어색했다.
책에서 독일의 풍광들은 의외로 고색창연한 느낌이 강하다. 전쟁에 대한 상흔도 많고, 마치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은 느낌인데 프랑크푸르트는 도시와 박물관 이 두 가지 요소가 적절히 혼재된 느낌이다. 그리고 예쁜 그림 엽서 같은 프랑크푸르트 기차역 모습은 스쳐 지나는 길에 만나는 풍경치고 너무 근사했다. 한편,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도시 뤼데스하임은 그 유명한 로렐라이 언덕이 있는 곳인데 세계에서 손꼽히는 썰렁한 여행지답게 ‘로렐라이’라는 팻말이 없다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일 듯 하다. 그러나 로렐라이 언덕에 배신감을 느꼈다 할지라도 뤼데스하임은 독일 백포도주의 명산지답게 드넓은 포도밭이 장관을 연출한다. 이곳의 아이스바인을 꼭 한 번 마셔보고 싶다.
어느덧 독일의 마지막 여행지인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하면 칸트가 매일 같은 시간 산책하며 건넜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칸트가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을 보고 시계를 정오에 맞췄다는 일화로 유명한 카를 테로도르 다리의 전경이 펼쳐진다. 다리를 지나 하이델베르크로 들어서면 하이델베르크대학이나 철학자의 길 등에서 학자들의 도시 느낌이 물씬 난다. 또 괴테의 연인이 남긴 구절-“사랑하고 사랑받은 나는 이곳에서 행복했노라”-은 하이델베르크 여정의 긴 여운을 남긴다.
아직 유럽의 그 어느 곳도 가본 적 없지만 독일은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과는 달리 그 나라만을 위한 여행을 가도 좋겠다 싶은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던 나라다. 그 이유는 역시나 독일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었다. <사색이 번지는 곳 독일>을 통해 비로소 독일의 알맹이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고, 책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뮌헨, 라이프치히, 본과 같은 도시들도 다른 책을 통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
이글은 "인터파크도서"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