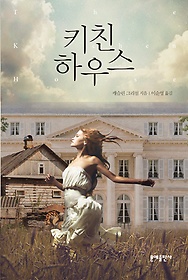 | 키친 하우스 이순영, 캐슬린 그리섬(Kathleen Grissom) | 문예출판사 | 20130620 평점      상세내용보기 | 리뷰 더 보기 | 관련 테마보기 |
어제 뉴스를 보는데 미국 사회가 또 다시 흑인 인종차별 문제로 떠들썩했다. 17세 흑인 소년을 사살한 히스패닉계 백인 자경단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에 대한 거센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과거에는 간혹 영화 속에서만 등장하던 흑인 대통령의 시대를 오늘날의 미국은 현실로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인종 갈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과 비하가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흑인들의 피해의식을 민감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런 때 읽은 캐슬린 그리섬의 <키친 하우스>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무렵 벌어진 흑인 인종 차별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은 미국 남부 버지니아의 한 농장이다. 주인이 사는 빅하우스와 노예들이 사는 키친하우스로 구성된 이곳으로 부모를 잃은 아일랜드계 백인 소녀 라비니아가 들어온다. 고아가 된 충격 탓인지 처음에는 이름과 나이도 모르던 라비니아. 그러다 기억이 돌아오고 슬픔과 혼란에 빠져 괴로워 하지만 이 소녀를 품어준 것은 키친하우스의 흑인 노예들이었다. 한편 이 책에서 라비니아와 함께 또 다른 화자로 등장하는 인물은 키친하우스의 흑인 노예 벨이다. 주인의 명령으로 라비니아를 돌보게 된 벨은 일부러 차갑게 대하며 거리를 두지만 불쌍한 처지의 라비니아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마음의 벽을 허문다.
피부색만 다를 뿐 진심으로 흑인 노예들과 한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라비니아와 그런 그녀를 딸처럼 형제처럼 받아들이는 흑인 노예들. 인종을 뛰어넘어 이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가족애는 얼음보다 차가운 빅하우스와 확연한 대조를 보인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만 급급하여 가족은 등한시 하고 벨의 친부라는 사실조차 숨기고 있는 주인, 끊임없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마약에 의존하며 공허함을 달래는 마님,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서도 그것을 은폐하였으며 노예 학대에 앞장서는 아들 마셜 등 빅하우스에서 사람의 온기는 느낄 수조차 없었다.
흑인 가족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파파와 마마의 그늘 밑에서 계속 함께 하고 싶었던 라비니아의 바람과 달리 그녀에게도 키친하우스를 떠나야 할 시간은 찾아온다. 그렇게 떠났던 라비니아였지만 늘 키친하우스로 돌아갈 날만 꿈꿨던 그녀에게 마셜이 돌연 청혼을 해 온다. 이제는 그녀가 키친하우스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라비니아였는데 현실은 더욱 냉혹하고 잔인했다. 남편 마셜은 자매 같던 노예 비티와 동침하는 것도 모자라 이미 과거에 벨을 강제로 범하여 이복 남매인 두 사람 사이에도 혼외 자식이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던 라비니아도 나중에는 시어머니처럼 체념하고 만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무시된 채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키친하우스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참고 견디는 것뿐이어서, 그것은 백인이지만 마치 빅하우스에 비치된 가구에 불과한 라비니아도 마찬가지여서 더욱 안타깝다. 그리고 마셜은 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악행들이 결국 자신의 정신을 황폐화 시키고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 이 비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방법뿐이었다. 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지만 그곳은 비극은 온상이기도 했으니까.
절망적인 순간에도 서로가 있어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는 키친하우스 가족들을 보며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는 말이 떠올랐다. 폐허가 된 곳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지라도 앞으로 그들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내 라비니아와 벨, 그리고 그 밖의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수동적인 모습만 보여 답답한 점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묘사였을 것이다.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종일관 주인에게 대항했다면 그들에겐 내일이라는 ‘삶’ 대신 당장의 ‘죽음’ 밖에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그 때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오늘날까지 과거의 아픔이나 비극이 계속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글은 "인터파크도서"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