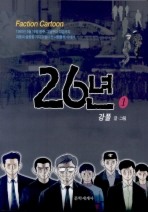1980년 5월 18일, 그 날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해마다 5월 18일이 다가오면 방송사 마다 앞 다투어 그 날의 이야기를 재조명해 왔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접할 수 있는 기회란 이렇게 언론 매체를 통해 비춰지는
단편적인 모습들 뿐이었다. 그리고 어린시절에는 어른들이 뿌려 놓은 전라도에 대한 편견의 씨앗이
나와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씩 싹 트기 시작했었다.
"우리 같은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에 놀러 가믄 안 된다카드라...
울 아빠가 카는데 자동차 번호판에 대구, 부산 이런거 적혀 있으면 차도 막 뿌사뿌고 그런다든데..."
이런 이야기를 진짜로 믿었던 유년기의 내게 광주는 절대 가면 안 되는 무서운 곳이었다.
그러나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릴 때 친구가 했던 말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내게 광주는 저만치 멀어져 있었다. 이런 심리적 거리감은 몇 년 전 업무 때문에 광주를 처음 가게 되었을 때
광주와 대구의 물리적 거리감으로 실감하게 됐다.
지도상으로는 분명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놀랍게도 대구에서 광주로 한 번에 가는 기차가 없다.
광역시나 되는 두 도시가 직통으로 연결된 가장 빠른 길이란 게 국도를 방불케 하는 88고속도로가 전부였다.
그래서인지 이십 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경상도와 전라도는 그 때의 그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 보였다.
그렇게 광주에 대한 기억도 옅어질 때 쯤, 강풀 작가의 <26년>을 읽게 되었다.
최근 모 사이트에서 강풀 작가가 새롭게 연재하고 있는 작품을 읽어 나가던 중 그의 다른 작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26년>도 알게 되었다.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른 채 읽어 나가자 마자 이 책은 그냥 만화는 아니겠구나...
읽고 나면 분명 가슴에 묵직한 돌을 하나 얹게 되겠구나... 직감했다.
올해로 광주민주화운동이 29주년을 맞았지만, 이 작품이 쓰여졌을 당시는 26주년이었다.
읽기 전 꽤 궁금했던 제목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었다. 모두가 잊은 듯 살아가지만, 그 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 가족과 가해자가 그들의 복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당시 총을 겨눴던 군인들은 직접적인 가해자이지만,
그들이 겨누는 복수의 칼 끝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있다.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면서도 사형에서 무기징역,
결국에는 2년의 수감생활을 끝으로 출소한 그를 향해 살아남은 자들은 국가를 대신해 직접 처벌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과 한 마디만 했었더라면,
그 날의 잘못을 시인하며, 후회하고 반성하는 기미라도 보였더라면...
벼랑 끝에서 몸을 던지듯 그렇게 무모한 복수의 시도는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기대조차 무색할 만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희생자 가족들과 평생 가해자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온 이가 느꼈을 분노가 마치 내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러면서 최근 벌어졌던 촛불집회와 경찰들의 과잉진압 논란이 29년 전의 상황과 오버랩되면서,
여전히 우리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말처럼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직접 죽인 사람과 죽음으로 몰아 넣은 사람... 둘 중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운 것인가를 떠나서
평생동안 진심으로 사죄하며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살아온 가해자를 희생자의 가족들은 용서한다.
결국 그는 용서를 받았지만, 끝내 떨쳐버릴 수 없었던 마음의 빚이 남아 있었다.
그의 손에 죽어간 이가 마지막으로 되물었던 한 마디.
"너는 지금 부끄럽지 않은가!"에 대한 대답을 26년 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로서 마지막으로 그가 용서를 구한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그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
평생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삶을 안겨준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힘든 선택으로 그 대답을 대신한다.
보는 동안 내내 가슴 속에 분노와 울분이 가득했다.
그리고 "너는 지금 부끄럽지 않은가!"란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다.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 일로 치부했던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를
돌보지 않았던 죄책감으로 나 역시 또 다른 가해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를 향해 마음껏 쓴 소리 하는 요즘을 두고, 어르신들은 세상 참 좋아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숱한 희생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없다는 것이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으면, 또 잠시 들끓다가 금새 수그러들 것이라는 인면수심의 가해자들이 갖는
안일한 생각들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바로 희생자들에 대한 무관심이었으니까...
'冊 it now'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천년의 금서 - 한국(韓國)의 고대사를 다시 쓰다 (0) | 2009.12.04 |
|---|---|
| 루머의 루머의 루머 - "그녀에게 미안합니다." (0) | 2009.12.03 |
|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완결편) - 세상을 바꾸는 작은 관심과 사랑 (0) | 2009.12.02 |
| 헝거게임 - 리얼 서바이벌 게임의 극한을 보다! (0) | 2009.11.30 |
| 남촌 공생원 마나님의 280일 - 현대문학에서 다시 찾은 고전의 맛! (0) | 2009.11.28 |